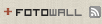Photo By Skyraider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 목까지
발 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 뿌리가 눕는다
풀(김수영:1974)
++++++++++++++++++++++++++++++++++++++++++++++
현상소를 하다 보면 수많은 필름을 통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손님들의 필름을 통해 간절곶과 외도(外島)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지요.
비록 늘 현상기 앞에 묶여 있지만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프랑스 영국 일본 태국 브라질 칠레... 세상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
하지만 때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장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병원사진]으로 이름 붙여진 그 필름들은 참으로 난감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사진관 건너편에 있는 외과 병원과 비뇨기과 의원에서 맡겨지는 것인데요이 필름들은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정말 대단한(?) 장면들이니까요.
비뇨기과의 사진들은 그야말로 '엽기'라는 말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주로 슬라이드 필름인데... 성기확대에 관한 아니 성기학대(?) 라고 이름 붙여질만한 사진들이죠. 즉 [남성의 고민]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맞아요! 다 큰 남자들은 늘 그게 고민이죠 후후후...
정상적인 시술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찍어결국 침소봉대(?)에 이르는 행복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간혹, 야매(?)로 받은 확대 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 과정을 담은 사진은 참으로 처절 하답니다. 왜 남자들은 [남성의 희소식] 앞에 이리도 무모 할까요? ㅋㄷㅋㄷ
한편 외과에서 나온 사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가 경찰 검안의를 겸하는 통에 사망사고 부검 사진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사는 해운대 지역의 각종 사망 사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진이증거용으로 쓰이기 위해 우리 사진관에서 현상/인화됩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던 어느 피자 배달원의 죽음, 무슨 고민이 컸는지 20층에서 내린 초등학생의 몸뚱아리, 부부 싸움하고 홧김에 현관에 목을 맨 새댁,
(퇴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서던 남편이 참 놀랬을것 같더군요)
일주일 전에 손주랑 필름 맡기로 오셨던...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일때는 또 얼마나 가심이 아픈지..휴!~
그리고 버스 바퀴에 깔린 6살 어린이의 으깨진 가슴....
사망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못한 어느 독거노인의 잔해와 구더기....
아직도 제 머리에는 수많은 사진들의 잔혹한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포토퀵 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용한 배달원들은밤이 되면 지킬박사의 하이드씨 처럼 폭주족으로 변신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참 말을 안들어요.
특히 헬멧 쓰라고 하면...악을 쓰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병원사진]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뚜껑'이 열린 장면을 보여주면 얼마간은 스스로 헬멧을 쓸 정도 입니다. -.-;;
전에 일하던 현상기사 중에선 [병원 필름]은 접수 봉투 껍데기도 안 만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그랬는지, 비위가 약해서 그랬는지 사진을 챙기다가 어쩌다 병원 사진을 보면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도 했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목을 맨 어느 청년의 주검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허름한 옷차림의 막노동꾼 모습으로 야산에서 목을 맸더군요.
[병원 사진]들 중에서 목을 맨 주검은 오히려 평범한 경우이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그 청년의 주검 사진을 살펴보다가 [그 사진] 때문에 저는 거의 가슴이 터질 뻔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눈물이 필름에 얼룩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눈물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저히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작업을 잠시 멈추고 저는 상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내려보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한참을 배회하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98년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노가다 일감이 끊길 무렵이지요.
게다가 IMF 한파가 한창 몰아쳤고,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곤두박질치던 때였습니다. 의사의 카메라는 나무에 매달린 그 주검과 주변이 함께 보이는 장면부터 시작하여주검으로 다가가 목덜미 부분을 앞 뒤로 클로즈업하고그 나무 주변에 흩어진 신발, 소주병 같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끈을 풀어 시신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옷을 벗깁니다.
질식사임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 한 명이 시신의 성기를 마치 치약 짜듯 움켜쥐어 정액 유무를 촬영하고, 시신을 뒤집어 똥이 묻은 항문을 주변을 클로즈업한 사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 까지가 여느 검안 사진들의 일률적인 레파토리(?) 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주검에는 바로 [그 사진]이 한 컷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노가다들이 많이 사용하는, 손바닥에 빨간 고무칠이 된 목장갑을 낀 채 주먹을 꼭 쥐고 있었는데장갑을 벗기고 굳어진 손바닥을 펴자 그 바닥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 사진]이 바로 저를 울게한 사진 이었습니다.
그의 검고 거친 손바닥에는 까만 매직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힘들어서요
삐뚤삐뚤한 그것은 13 글자의 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제 갓 20대 후반의 한 젊은이의 어깨를 이토록 짓눌렀는가?
마지막까지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했건만... 소주 한 병의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생각이 더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막막한 가슴에 눈물만 났습니다.
늙은 어머니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날카로운 상처와 둔중한 아픔을 남기고 가신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
어느 것 하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삭막한 세상을 홀로 등진 당신! 오늘 당신을 추모 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 이 아픔을 간직하며 꺼진 연탄재 만큼의 온기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2003. 9. 10
출처 : 레이소다 덕헌님(http://www.raysoda.com/badak)
솔직히,
고작 한 줄의 글에 이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희망이 담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절망이 담길 수도 있다는 것, 카메라를 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지금 사진기를 쥐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